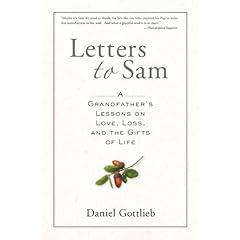Andrew Wyeth와 Edward Hopper 페이지들을 대략 마무리 짓고 나니, 미국의 사실주의 화가들의 계보가 대략 머릿속에 정리가 된다. 신생국가 미국의 미술은 유럽의 미술사와는 약간 시기적으로, 성격적으로 차이가 나게 진행되었다. 예컨대 유럽에서 19세기 중반, 후반에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영향으로 사회주의적 색체가 강한, 혹은 사회 비판적인 사실주의 화풍이 휩쓸고나서 '인상파' 화가들이 새로운 작법을 가지고 등장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인상파 작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속에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사실주의적 작법이 공존하게 된다. 사회비판적인 사회 사실주의적 화풍은 오히려 미국의 인상파 화풍이 물러나면서 1930년대에 꽃피게 된다.
19세기말, 20세기초부터 진행되던 미국의 사실주의는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경제대공황으로 인한 빈민층 증가와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으로 사회성 메시지가 강한 미술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 이 사회성이 강한 미술의 일부는 '사회주의 사상'과 무관하다고 할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소련의 공산주의를 지지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미국적 토양위에서 자생한 미술사조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할 것이다. 도시빈민의 문제, 혹은 노동의 문제등 사회 문제를 그림으로 옮긴 화가들의 모임중 '애시캔 (Ashcan)' 학파, 이들과 정체성에 차이가 없는 '8인회 (The Eight)'이 유명하다. 이들을 Social Realist (사회 사실주의자)라고 통칭한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역시 공공 미술 프로젝트의 영향권 안에서 '미국의 풍경'을 통해 미국의 '정체성'을 살리자는 취지의 회화운동이 미국의 중서부 화가들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이들을 지역주의자 (Regionalist)라고 부른다. 위의 사회사실주의적 화가들이 '진보적' 성향의 인물들이었다면, '미국의 풍경'에 역점을 둔 '지역주의 화가'들은 다소 보수적인 색채를 띄고 있었다 할 수 있다. 대표적인 화가로 Grand Wood, Benton 등이 있다.
Edward Hopper 는 사회사실주의의 기수라 할 수 있는 Henri (헨라이-로 발음한다)의 제자였고,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혹자는 Edward Hopper 를 애쉬캔 (Ashcan) 학파의 일원으로 분류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에드워드 호퍼 자신이 이런식의 분류를 싫어했다. 호퍼는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사상적 그룹에도 속하지 않으며 미술가로서 이런 사상적 색채를 띈다는 것 자체가 유치한 짓이라는 입장을 평생 관철했다.
Edward Hopper 보다 한세대 이후에 탄생한 Andrew Wyeth 를 '지역주의자' 무리에 포함시키는 미술사가도 가끔 보인다. 그런데 이또한 무리스러운 노릇이, Wyeth 역시 예술지상주의자인지라 어떤 '이데올로기'와 자신의 그림을 연결짓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때문에, 나는 미국의 사실주의 미술가 계보에서 Edward Hopper 와 Andrew Wyeth 를 '외톨이'들로 분류하는 편이다. 나는 외톨이들을 좋아한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내가 미국미술사를 정리하면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우선 할 일은, 사회 사실주의자들 중에서 내 맘에 다가오는 (혹은 잘생긴) 화가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지역주의자들을 정리하는 일 일 것이다. (물론 이러다 기분 내키면 식민시절의 풍속화가를 갑자기 소개하게 될지도 모른다.)
연결: http://americanart.textcube.com/133